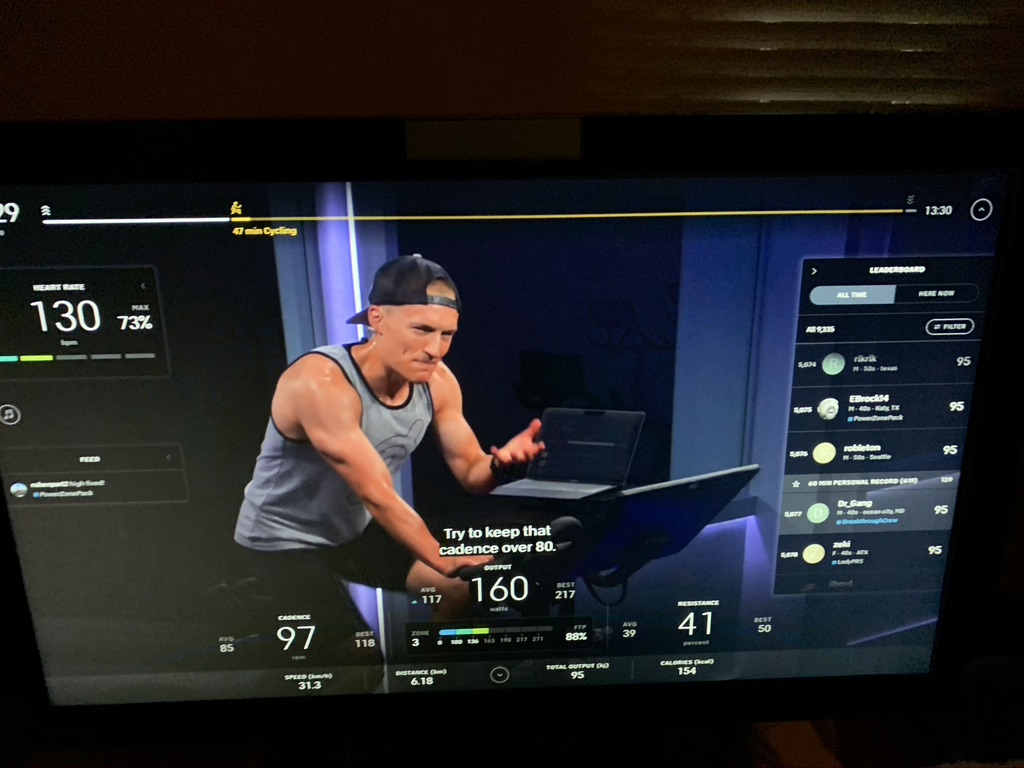COVID19를 계기로 가장 크게 타격을 맞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이지 싶다. 한국도 마찬 가지겠지만 미국 대학의 경우 COVID19 자체도 그러하지만, 이를 계기로 트럼프 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정책 변화 등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 여파가 지속되리라고 본다.
물론 비지니스 스쿨의 일부 프로그램 (MBA)의 경우는 오히려 지원자가 느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긴 하다. 더군다나 COVID19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다.
다행히 내가 있는 Salisbury University는 유학생 수가 적고, 지역에서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는 터라 약간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다른 학교의 아주 horrible 한 소식들에 비해서는 얌전히 이 난관을 겪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앞으로 오랜 기간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 내가 2017년 임용이 된 뒤로 계속적으로 노교수님들이 은퇴를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새로운 교원들로 자리를 메우고 있다. 올 때만 해도 과 전체에 약 20여 명의 교수 중에 나 혼자 한국 사람이었는데 (중국계 1명, 인도계 1명, 나머지 다 미국인), 이제는 한국 교수님이 과에만 해도 나를 포함해 4명이 되어 다수가 되어 버렸다. (다수가 되어 버린 ㅎ)
그렇게 지속해서 일종의 물갈이가 되고 있는데, 어려운 COVID19 상황에서도 신규 임용을 추진하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실제로 Candidate를 캠퍼스로 직접 불러서 인터뷰하는 정말 몇 안되는 학교 중에 하나였다. 최근 Campus visit(임용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과정)을 오는 지원자들을 보면 '참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자극을 받는 건 항상 행복하면서 두려운 일이긴 하다.
이번 주 내내 3명의 Candidate이 Campus visit을 하였고,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직접 발표도 듣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모든 지원자가 그러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약간이라도 직장경험을 가지다가 Academia로 온 사람이 많았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발표를 들어 보면, 연구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수업에서도 굉장히 실무적인 방법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늘 온 지원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박사과정에서부터 수업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어서 이제는 박사과정생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물론 연구 주제를 현업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수업에서도 실제 프로젝트를 접목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아 상당히 신선했다.
개인적으로도 바로 연구자가 되기보다는 약간이라도 경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약간 detour한 나의 경험은 연구뿐만 아니라 수업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사실 말이 좋아 Project-based teaching이지만, 이를 위해서 교수는 Teacher 이전에 Project manager의 롤을 해야 한다. (그 외에 학교 서비스와 연구를 제외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시간과 돈, 데이터를 공유해 가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전해봤었고, 사실 한국에서는 Service에 대한 명확한 Scope definition이 불분명하고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돈 낭비라고 (많은 경우 그냥 학교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아니면 지인의 부탁이니 없는 샘 치고 하는) 참여하다 보니,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Client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주요한 관건인데 '나는 바쁘니 그리고 내가 돈을 내었으니 알아서 결과만 다오' 하는 식의 접근법이 많다. 어떤 분들은 학생팀을 막내 직원 부리듯 잡히는 단순 일을 던져주는 경우도 보았다. 2년 동안 그 중간 역할이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결론은 좋은 프로젝트/컨설팅 결과를 위해서는 갑과 을 모두의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법적 문제가 항상 귀결되다 보니 Project의 Scope이 명확한 편이고 기업들의 참여 또한 적극적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들도 학생들의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커뮤니티에서 함께 교육하고 결과도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적이 많았다. 그들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오늘 지원자의 발표와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묻고 답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이 더욱더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것이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불신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보면, 연구 또한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가 많이 될 것이고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본다면 더욱더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방대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대학 교육이 어떻게 변해갈지 몸담고 있는 나도 모르겠다.
하나 확실한 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고 그것이 무엇 일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교수 vs 미국교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수, 정년(Tenure)을 받다. (0) | 2020.12.29 |
|---|---|
| 나는 학자감인가? (2) | 2020.06.10 |
| 코로나 '전례없는' 사태를 대응하는 대학의 노력들 (0) | 2020.05.01 |
| Online / Offline / Hybrid 강의 (0) | 2020.03.05 |
| You've got mail. (0) | 2020.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