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대학을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외국에 대한 생각이나 접촉할 기회가 거의 전무 했다시피 했다. 기껏해야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가끔 나오는 유명한 내한 가수들의 인터뷰 정도(?)가 교과서 외에 내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국 문화였고, 나보다 선배들이 가끔 수기에서 언급하던 AFKN이나 영어 방송을 들은 적도 접근하는 방법도 몰랐다. 다만, 입대해서 논산 훈련소를 마칠무렵 카투사를 뽑았는데, 그때 차출되어 가는 동기들을 보면서 '아! 저 줄로 갔으면 영어를 더 잘 했을텐데'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며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있다. (* 실제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학생 중에서 카투사 출신들을 꽤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제대를 하고 유럽배낭여행이 아마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외국을 경험해본 기억이었고, 아직도 싱가포르를 거쳐서 British Airway를 타고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가는 비행기안에서 승무원이 '음료 뭐줄까?' 라는 질문에 '코카콜라!'라고 답변했던게 아마 내 인생에 처음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였던게 아닌가 싶고, 영국 히드로 공항 입국심사할때 심장이 쿵쾅거리며 버벅거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난한 배낭여행객이었던 그때 조금이나마 싼 가격으로 밥을 먹으려고 찾아다녔던 학교들에서 묘한 매력을 느껴 지금도 여행갈 때 오래된 학교를 찾는건 나에게는 꽤나 즐거운 일 중에 하나이다. 아마도 그렇게 학교에 대한 묘한 매력과 햇볕을 받으며 잔디밭에서 책을 보고 있던 교수들, 학생들의 모습이 참으로 멋있게 보였었다.


거기에 군대 시절 일과시간을 끝내고 가장 열심히 보았던 드라마가 '카이스트'였는데 물론 드라마지만 추파춥스 캔디를 물고 로봇을 만들며 무언가 몰두하는 모습들에서 꽤나 희열을 느꼈었는데, 그 두가지의 경험이 합쳐서 이후 미국대학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변변치 않은 토플 점수에 유학원을 끼지 않고 (강남에 있는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 입이 떡벌어져 그냥 스스로 진행해 보기로 한다), 스스로 틈틈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간중간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 가며 10여군데 학교에 넣었는데, 사실 한참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건데, 군대 가기 전의 나의 학점과 커트라인을 겨우 넘기는 토플점수 (500 점 정도 였던 듯)와 형편없었던 자기소개서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이리라. 또, 그때는 외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커서 막연히 아르바이트를 한 금액을 쏟아가며 비싼 전형료를 부담하고 토플 점수를 별도로 우편으로 붙여가며 지원했지만, 되었더라도 학비가 지원되지 않았을테고 장학금을 받기 어려웠을테니 미국의 주립대학을 간다하더라도 out of state tuition에다가 생활비까지 하면 감히 살아남지 못했을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도전이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전부 리젝을 받은 좌절스러운, 군대 제대이후 첫 프로젝트의 쓰디쓴 패배의 잔을 들수밖에 없었고, 이후 복학하여 그 형편없는 학점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유학에 대한 꿈은 마음 한구석 깊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사그라든 줄 알았던 생각이 스물스물 다시 피어오른건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석사과정에서다. 그때 한참 드라마 Friends에 빠져있었던 시기라 1년차에 교수님께 대뜸 "미국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요청이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논문을 써라. 그럼 학회를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논문이라고는 읽은 적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쓰는건지 알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냥 닥치는대로 한국 논문들을 읽고 영어논문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뭐가 서론이고 뭐가 방법론이고 뭐가 결과인지 당연히 알지 못한채 그냥 소설 쓰듯 뭔가 계속 썼다. 물론 학과 공부는 뒷전이었고, 덕분에 한 학기 장학금 못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논문 제출 일주일 전부터 교수님의 끊임없는 야단과 수정이 반복되는 나날이었고, 일주일을 거의 밤을 새다시피 억지로 만들고 만들어 겨울 우리랩 최초의 랩전체 Las Vegas Conference를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에 대한 나의 첫 경험이다 (2003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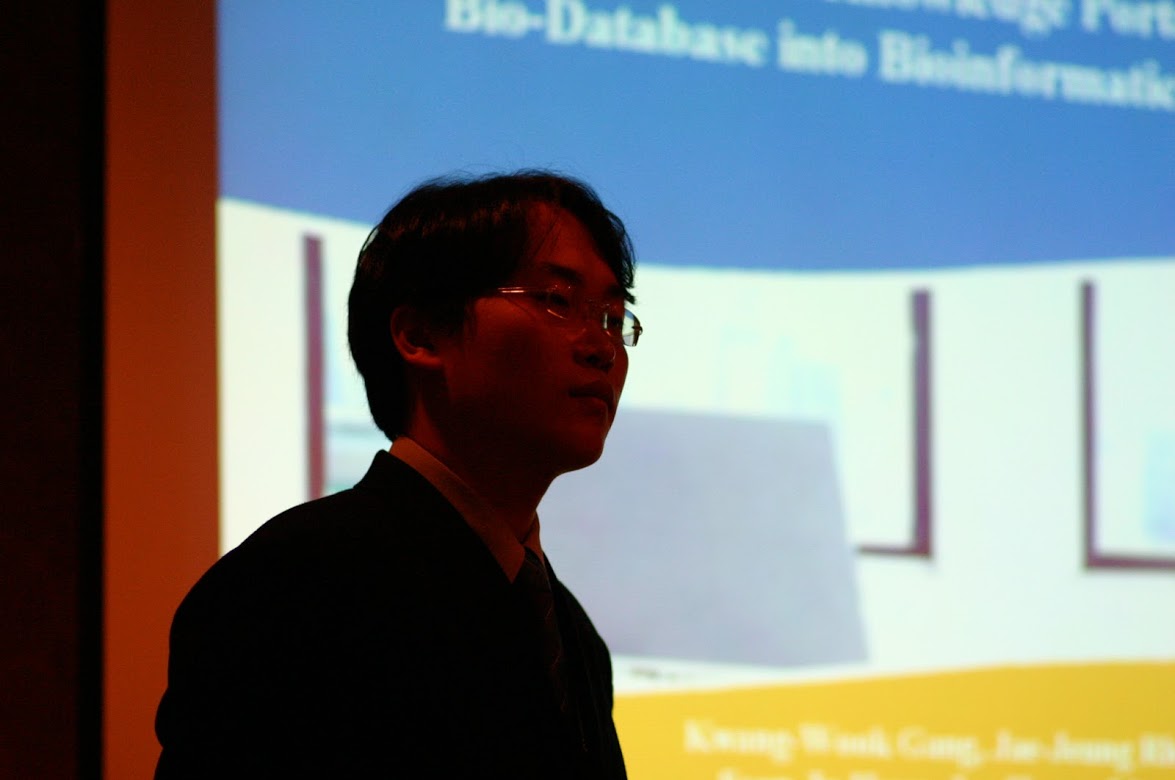
그 학회에 붙여서 사실 나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바로 미드 Friends의 배경이 되었던 NYC였다. 그래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학회가 끝나고 뉴욕에 며칠만 들렀다 오겠다고 다시한번 용감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라고 말씀해 주셨다. Friends로 세뇌가 되어서 였던지, LA와는 다른 뭔가 우중충하고 우울한 느낌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뉴욕을 참 좋아하게 되었고, 그때 인석이 형과 혜정이의 도움으로 상대적으로 수이 뉴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억나는 뉴욕에서의 첫 목적지는 바로 '감미옥' (지금은 그 위치를 이전하였음). 그 구수한 설렁탕을 잊을수가 없었고 그 첫 맛을 잊지 못해 10년뒤 유학생활 할때 자료조사차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뉴욕에 내려올때 마다 그 집에서 시작을 했었다. 더 놀랐던 건 형이 감미옥 바로 앞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밥값보다 주차비가 더 많이 나와 '역시 뉴욕 b'하며 엄지척을 날려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던가 Time Square를 둘러보느라고 길거리에 대놓았던 형의 차가 견인되어 뉴욕시의 첫날밤을 견인차 보관소에서 찾느라 진땀 빼고 근사한 한끼 식사 비용을 날려 미안함을 가지게 된건 에피소드랄까..
그때 부터 아마 미국 그리고 뉴욕을 나도 모르게 꿈꾸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 첫 여행에서 뉴욕에 빠져 셔터를 연신 눌러대던 내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렇게 나의 맨하튼 첫 여행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 10년뒤 나는 다시 JFK(뉴욕공항)로 다시 내 생활을 시작하게 될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다. 그 오랜기간 드라마로만 봤던 뉴욕을 직접 가본다는 것 외에 뉴욕은 그냥 좋았다. 드라마에서 나온 브랜드 상점들이 즐비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미국의 심장과도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구나, 언젠가 이곳에 오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에게 미국의 경험을 선사해준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석사과정이 끝이 나고 한국기계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석사과정에서 IT Business 라고 지금에 와서 보면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가까운 전공을 한 내가 왜 갑자기 기계연구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라. 뭐 특별한 생각은 없었고 같은 대전 연구단지에 속해 있고 입사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마지막 대규모 면접에서 (영어로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왜 우리(기계연구원)가 IT Business을 전공한 나를 채용해야하는지를 설명해봐라 라는 의심많은 면접관들의 질문에 되도록 열심히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결국 채용이 되었고 정신없이 나의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정부출연연을 보면 크게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직군을 구분할 수 있고, 나는 연구기획 분야로 하여 연구직으로 입사를 하였다. 당시 원장님이 새로운 연구분야를 찾기 위해 '미래기술연구부'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나를 1번으로 발령을 내어주셨는데, 나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박사님들이 한분두분 조인을 하여 조직의 새로운 연구분야를 찾는 Skunk works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자신이 공부한 분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고 나는 다른 박사님들의 발표를 지켜 보면서 (사회과학 전공한 사람이 공학의 박사분들이 하는 발표를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다) 뭔가 나도모르는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조직에 비해서 부서가 꽤 젊은 연구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좋았는데, 그때 일끝나고 시간이 나면 으레 소주 한잔씩 하던 형님들이 지금 성균관대의 김근형 교수님과 원광대의 조영삼 교수님이었다. 두 분과 소주한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일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당시 형님들의 나이가 지금의 나보다 아마 어리지 않았을까)로 꽃을 피웠는데, 그때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를 하신 김근형 교수님이 나의 과거 이야기 관심사를 듣더니 유학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해주셨다. 물론 KAIST에서 박사를 하셨던 조영삼 교수님도 "그래 그래라"라며 힘들 북돋아주셨다.
다 주변에 상대하는 분들이 Ph.D. 이다 보니 Peer pressure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속해 있다 보니 스스로도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점점 굳건해 졌다. 물론 처음에는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KAIST에서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경영학관련 스쿨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어 지원이 어려웠고 나중에 기술경영학과가 생기긴 했지만, 그건 이미 내가 미국 박사과정을 가기로 마음먹은 후였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오랜시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던 미국생활에 대한 꿈, 유학에 대한 꿈을 실천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한국교수, 미국교수 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는 이렇게 한국/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5 - 유학이 고민되지 않으셨나요? (0) | 2020.01.08 |
|---|---|
| 나는 이렇게 한국/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4 - 어떻게 미국대학 박사과정을 지원하였나요? (0) | 2020.01.07 |
| 나는 이렇게 한국/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3 - 영어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3) | 2020.01.06 |
| 나는 이렇게 한국/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2-1 - 어떻게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보태기) (0) | 2020.01.04 |
| 나는 이렇게 한국/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1 - 어떤 사람이었나요? (0) | 2020.01.01 |